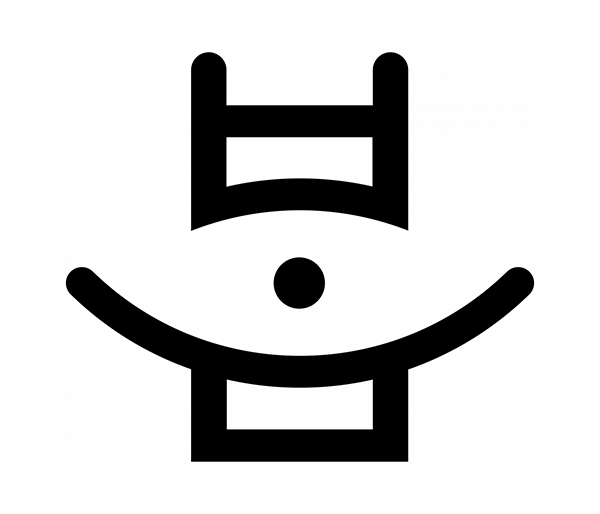전관 거류지로 개방되는 부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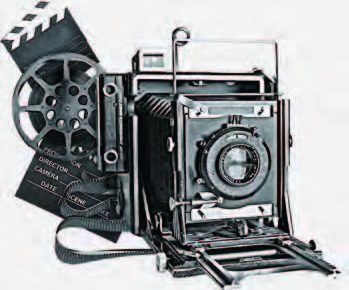
1876년 개항으로 빗장이 열리는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는 가장 가깝게 인접했던 이유로 인해 격변하는 시대의 요충지로 급부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비켜갈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부산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다. 개항되던 해 인구는 고작 9,000여 명이었으며 외국인이래야 대마도에서 건너와 살고 있던 일본인 82명이 모두였다. 주택은 한 채씩 듬성듬성 따로이 떨어져 있을 만큼 한가로웠다. 부산진, 고관, 초량 지역에 들어서야 집단적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살고 있었다. 오늘의 토성동, 초장동, 남부민동, 부민동에서 초량까지를 합쳐서 샛터라고 불렸으며, 하단은 낙동강 포구로 번성했으나 대신동 쪽은 인가가 한 채도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자갈치는 자갈밭 해안이었으며 용두산공원에서 영선고개 비탈길을 올라야만 영주동으로 통했으며 그 길은 절벽을 깍아 만든 좁은 길어어서 매우 위험했었다.
오늘의 봉래초등학교 앞은 바다였고, 해안길은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 초량에서 작은 길 하나를 지나면 어촌이 자리했고 고관을 경유하여 부산진 자성대에 이르고 이어 적기 신선대 쪽도 인가는 한 채도 없었다. 이같이 갯마을에 불과했던 부산포(富山浦)는 어촌이나 다름없었던 한적한 곳이었다.01
그러나 개항된 부산은 일본과의 소통을 위해 조계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대거 이주, 500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개항 첫 해 부산포의 얼굴은 급변해 가고 있었다.
01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년